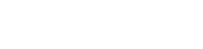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b>타자의 시학
시 쓰기는 자기고백의 영역 같지만 기실 타자와 만나는격렬한 행위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를 새로 보는 행위이며, 주어와 서술어 간의 자동 연결 상태를 끊고 새로운 진술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새로 본다는 것은 낯설게 본다는 것이며 그것은 언어를 타자로 대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타인 역시 타자다. 시인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그기억 속에서 공감과 연민 등의 감정적 개입을 역동적으로 펼치며 자신의 감정 지도에 타자를 그려 넣는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도 회상할 수도 없다. 한 인간의 생은 죽음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사실 삶의 영역이다. 시간 역시 낯선 타자다. 회상으로 존재하는 과거는 우리가 통과해왔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지만 한 발짝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다. 자신에게 자신은 타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일 것이다. 거울을 보고, 분열을 회피하는 등,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자기 안의 타자를 잠재우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시를 쓰는 행위는 이 모든 타자들을 직시하겠다는 자기 선언이다. 현재에 몰입된 자신에서 벗어나 낯선 언어의 숲에서, 지나쳐버렸던 타인을 호명하고, 죽음을 마주대하며, 내 안의 낯선 나를 만나겠다는 결심이다. 그럼으로써 자기와만 관계하는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벗어나 성숙하고 활달한 시선으로 타자를 수용하려 한다.
이영숙 시인은 이번 시집 『히스테리 미스터리』에서 비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그려냈다. 바깥과 자기 안에서 끼는 수많은 타자들과 교섭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확장을 꿈꾼다. 단일한 주체의 자기고백을 넘어 수많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 타자들이 웅성거린다.
<b>언어와 주체의 타자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장은 생동감 넘치는 언어이다. 다른 범주에 있는 언어와 언어가 충돌하여 새로운 언어를 내놓는다.
ㄱ) 관절이 없어서 나는 기차가 되지 못했다―「버스의 평균율」
ㄴ) 떠내려 온 시간들의/삼각주―「공원묘지」
ㄷ) 모서리가 다 닳는 새벽―「까마귀 네트워크」
ㄹ) 우리는 무지개처럼 안이했다―「버스의 평균율」
ㅁ) 인공위성 어떤 정신이기에/ 명아주열매처럼 저리 골똘
한가―「장소의 불문율-폐가」
ㅂ) 늘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새벽―「목요일의 패러독스1」
ㅅ) 토끼는 일평생 토할 것 같은 기미만 가지고 살아온 이름이 억울해―「간도 쓸개도 조문弔問도 없이」
ㄱ)의 경우 기차 차량의 이음새를 신체의 관절로 표현했다. 신체를 표현하는 중심 의미를 유사성에 주목하여 무생물로 확장했다. ㄴ)에서는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을 넘어 하강적으로 지나 하류에 퇴적된 상황을 ‘삼각주’로 구체화했다. ㄷ)역시 ‘새벽’이라는 관념 대상과 그 특징을 ‘모서리가 닳다’로 은유했다. ㄹ)에서는 ‘무지개’와 ‘안이(安易)’라는, 유사성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두 단어를 직유로 과감하게 연관시켰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 햇빛이 굴절되는 현상인데,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또 금방 사라진다. 그렇기에 이 직유는 적확하다. ㅁ)의 경우는 ‘명아주열매’가 ‘인공위성’보다 더 미지의 대상인데 기지의 대상을 미지의 대상으로 비유하여 기존의 비유 도식을 역전시켰다. ‘포클레인같은 손’같은 표현이다. ㅁ)의 표현은 오히려 ‘명아주열매’의‘골똘’함에 주목한 것으로 시 전체의 맥락에 관계없이 명아주열매라는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ㅂ)의 경우 ㄷ), ㄹ)과 마찬가지로 관념의 구체화에 공을 들인 예인데 더 주목할 것은 ‘배송’이라는 단어와 새벽을 연관시킴으로써 이질적인 영역에 놓여있던 단어들을 은유의 체계로 재배치한 점이다. ㅅ)에서는 음성의 유사성에 입각해 시어를 채택하여 내용과 형식(음성)을 연관 짓는다.
이처럼 이영숙 시인은 다른 영역의 언어를 연결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영역 간의 중매를 벌이면서 새로운 의미의 자식들을 풍성하게 생산한다. 생물과 무생물, 시간과 사물, 감각과 사물, 관념어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이질적인 단어들이 서로 넘나들며 섞인다. 두 영역 간의 만남은 타자 간의 만남처럼 격렬함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단어는 차이 속에 동일성을, 다시 동일성 속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의미 바탕으로는 완전히 상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소유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시어들은 생동감 넘친다.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화자 차원에서도 타자성이 구현되 어 있다. 단일한 주체의 독백적 진술보다는 타자의 목소리를 담거나 청자를 설정한 다성적 주체의 목소리가 곳곳에 등장한다.
김유석(문학평론가)
시 쓰기는 자기고백의 영역 같지만 기실 타자와 만나는격렬한 행위다.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를 새로 보는 행위이며, 주어와 서술어 간의 자동 연결 상태를 끊고 새로운 진술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새로 본다는 것은 낯설게 본다는 것이며 그것은 언어를 타자로 대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타인 역시 타자다. 시인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그기억 속에서 공감과 연민 등의 감정적 개입을 역동적으로 펼치며 자신의 감정 지도에 타자를 그려 넣는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도 회상할 수도 없다. 한 인간의 생은 죽음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도 사실 삶의 영역이다. 시간 역시 낯선 타자다. 회상으로 존재하는 과거는 우리가 통과해왔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지만 한 발짝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다. 자신에게 자신은 타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일 것이다. 거울을 보고, 분열을 회피하는 등,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자기 안의 타자를 잠재우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시를 쓰는 행위는 이 모든 타자들을 직시하겠다는 자기 선언이다. 현재에 몰입된 자신에서 벗어나 낯선 언어의 숲에서, 지나쳐버렸던 타인을 호명하고, 죽음을 마주대하며, 내 안의 낯선 나를 만나겠다는 결심이다. 그럼으로써 자기와만 관계하는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벗어나 성숙하고 활달한 시선으로 타자를 수용하려 한다.
이영숙 시인은 이번 시집 『히스테리 미스터리』에서 비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그려냈다. 바깥과 자기 안에서 끼는 수많은 타자들과 교섭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확장을 꿈꾼다. 단일한 주체의 자기고백을 넘어 수많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 타자들이 웅성거린다.
<b>언어와 주체의 타자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장은 생동감 넘치는 언어이다. 다른 범주에 있는 언어와 언어가 충돌하여 새로운 언어를 내놓는다.
ㄱ) 관절이 없어서 나는 기차가 되지 못했다―「버스의 평균율」
ㄴ) 떠내려 온 시간들의/삼각주―「공원묘지」
ㄷ) 모서리가 다 닳는 새벽―「까마귀 네트워크」
ㄹ) 우리는 무지개처럼 안이했다―「버스의 평균율」
ㅁ) 인공위성 어떤 정신이기에/ 명아주열매처럼 저리 골똘
한가―「장소의 불문율-폐가」
ㅂ) 늘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새벽―「목요일의 패러독스1」
ㅅ) 토끼는 일평생 토할 것 같은 기미만 가지고 살아온 이름이 억울해―「간도 쓸개도 조문弔問도 없이」
ㄱ)의 경우 기차 차량의 이음새를 신체의 관절로 표현했다. 신체를 표현하는 중심 의미를 유사성에 주목하여 무생물로 확장했다. ㄴ)에서는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을 넘어 하강적으로 지나 하류에 퇴적된 상황을 ‘삼각주’로 구체화했다. ㄷ)역시 ‘새벽’이라는 관념 대상과 그 특징을 ‘모서리가 닳다’로 은유했다. ㄹ)에서는 ‘무지개’와 ‘안이(安易)’라는, 유사성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두 단어를 직유로 과감하게 연관시켰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 햇빛이 굴절되는 현상인데,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또 금방 사라진다. 그렇기에 이 직유는 적확하다. ㅁ)의 경우는 ‘명아주열매’가 ‘인공위성’보다 더 미지의 대상인데 기지의 대상을 미지의 대상으로 비유하여 기존의 비유 도식을 역전시켰다. ‘포클레인같은 손’같은 표현이다. ㅁ)의 표현은 오히려 ‘명아주열매’의‘골똘’함에 주목한 것으로 시 전체의 맥락에 관계없이 명아주열매라는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ㅂ)의 경우 ㄷ), ㄹ)과 마찬가지로 관념의 구체화에 공을 들인 예인데 더 주목할 것은 ‘배송’이라는 단어와 새벽을 연관시킴으로써 이질적인 영역에 놓여있던 단어들을 은유의 체계로 재배치한 점이다. ㅅ)에서는 음성의 유사성에 입각해 시어를 채택하여 내용과 형식(음성)을 연관 짓는다.
이처럼 이영숙 시인은 다른 영역의 언어를 연결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영역 간의 중매를 벌이면서 새로운 의미의 자식들을 풍성하게 생산한다. 생물과 무생물, 시간과 사물, 감각과 사물, 관념어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이질적인 단어들이 서로 넘나들며 섞인다. 두 영역 간의 만남은 타자 간의 만남처럼 격렬함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단어는 차이 속에 동일성을, 다시 동일성 속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의미 바탕으로는 완전히 상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소유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시어들은 생동감 넘친다.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화자 차원에서도 타자성이 구현되 어 있다. 단일한 주체의 독백적 진술보다는 타자의 목소리를 담거나 청자를 설정한 다성적 주체의 목소리가 곳곳에 등장한다.
김유석(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