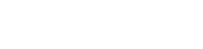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삶, 끝이 없는 구도(求道)를 향해 가는 절절한 인간의 모습은 이 시집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명마를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우쭐함’이야말로 작가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일갈한다. “설익은 마장마술 몇 개 앞세워 명마의 주인임을 자처했으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따름”(「저자 발문」)이라고 고백한다.
하늘을 날던 말이 있었다
죽간에 갇혀 낡은 활자나 겅중대는 검은 말이 아니라
구만리장천이 자유자재인
신령스러운 흰 말이었다 한번 솟구칠 때마다
천지간의 말씀이 인동당초문으로 출렁였다
뿔에선 언제나 서늘한 서기가 뻗쳤고
갈기와 꼬리에선 날카로운 불꽃이 일었다
감히 범접 못 할 위용이었다
그 시절, 하늘과 땅은 그 뜻이 조금의 어긋남이 없었다
때맞추어 비의 말씀이 대지를 적셨고 감사의 곡물이 제단에 올랐다
우순풍조하여 태평성대였다
이에 경향 각지의 선비들이 몰려와 저마다의 붓을 들어 말씀 한 필 짓기를 청하였으나
무슨 비의가 있음인지 도제를 두지는 않았다
- 「천마총」 부분
담대한 자연에 비해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존재인가. 장문석 시인은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천마총’을 들여다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한편, 그 속에서 자못 작아지기만 하는 인간을, 스스로를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리하여 「천마총」 속 ‘흰 말’은 “항간에 자신의 이름을 팔아 혹세무민하는 무리가 출몰한다는 풍문에 접하고는/사나흘 장탄식 끝에 스스로 짠 백화수피 14진 속으로 들어가/여태껏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시인은 탄식한다.
겨울 갈대를 소재로 한 시 한 편을 보자. 이는 마치 ‘대지(大地)’라는 어머니가 인간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며 자신을 다 내어주는지를 섬세한 풍경화로 그려낸 한 편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강바닥에 눕혔다”라는 마지막 백미는 시의 여운을 한층 더 깊고도 길게 끌어올린다.
노랑부리개개비 한 쌍이 외진 물골 숨어들다 그만 남으로 가는 일행을 놓치고 말았다 그 철없는 사랑을 위해 허리춤에 작고 아담한 둥지를 틀어 주었다 물기 내린 옷섶이 따뜻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작은 웅덩이를 만들기도 했다 하류에서 피난 온 버들치 가족이 거기에 임시 거처를 정했다 파수를 겹겹 둘러 세우고 살얼음도 살짝 얹어 주었다
(중략)
서로의 뿌리를 얽으며 뜨겁게 사랑도 했다 우우우 온몸을 흔들며 깊어졌다 그러다 새끼들 태어나 초록의 걸음마를 시작하면 기꺼이 그들의 지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강바닥에 눕혔다
- 「겨울 갈대」 부분
겨울은 춥고 어둡고 깊다
상처가 자라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상처는 아무는 게 아니라
덧나는 것, 곪아서 터지는 것이다
깊은 계곡 얼음장 밑에서
가재 한 마리
상처의 급소를 가위질하고 있다
그때마다 눈보라는 내리치고
바위틈에선 청랑한 맥박이 돋는다
아프지 않다
어쩜 너는 급소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이젠
한숨 자 두도록 하자
- 「동지를 지나며」 전문
저물 무렵, 그가 꽃노을 한 필 짊어지고 돌아왔다
수평선을 통째로 물들이는 진홍빛 대단이었다
저 빛이 생의 곡절이라면 아주 먼 바다로부터 출렁여 왔겠다
고래 등 타고 호기롭게 물줄기 뿜어대던 젊은 날도 있었겠다
기항지의 등댓불 바라보며 갈매기도 몇 마리 날려 보았겠다
검은 암초에 부딪혀 하얗게 울부짖은 날도 많았겠다
그리하여 시퍼렇게 멍도 들었겠다 결국은
실핏줄이란 실핏줄 모두 터져 걷잡을 수도 없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토록 장엄하겠는가!
철썩철썩, 가위질 소리인가 하면 바느질 소리
그날 저녁, 그는 손수 마름질한 비단옷 한 벌 지어 입고 수평선을 넘어갔다
밤새도록 등대가 불을 밝혔다
- 「꽃지 노을」 전문
간장독을 여니 바닥이다
간신히 한 종발 뜬다
드르륵, 긁히는 소리
솔아 붙은 소금의 결정이다
맛을 보니 짠맛, 깊다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다
- 「씨간장」 전문
처음 시를 쓸 때에는 미처 몰랐지만 시를 쓰면 쓸수록 시인은 아마도 ‘시’가 두려웠을 것이다. ‘말’이 두려웠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말은 순식간에 조로서도(鳥路鼠道)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테고, 마방이 고삐를 느슨하게 잡은 어느 순간에는 “비루먹은 당나귀” 꼴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마방의 운명 역시 똑같이 추락해 버릴 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오늘도 겨울 얼음장을 보며, 꽃지 노을 대단을 보며 ‘천마’를 향한 길을 부지런히 가고 또 간다. “실핏줄이란 실핏줄 모두 터져 걷잡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장엄”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기에. 시인의 업(業)이란 무릇 기다리고 상처 입는 가운데서 익어 가는 것이기에. 깊고 묵직한 궁극의 “짠맛”을 향하여 시인은 간다.
하늘을 날던 말이 있었다
죽간에 갇혀 낡은 활자나 겅중대는 검은 말이 아니라
구만리장천이 자유자재인
신령스러운 흰 말이었다 한번 솟구칠 때마다
천지간의 말씀이 인동당초문으로 출렁였다
뿔에선 언제나 서늘한 서기가 뻗쳤고
갈기와 꼬리에선 날카로운 불꽃이 일었다
감히 범접 못 할 위용이었다
그 시절, 하늘과 땅은 그 뜻이 조금의 어긋남이 없었다
때맞추어 비의 말씀이 대지를 적셨고 감사의 곡물이 제단에 올랐다
우순풍조하여 태평성대였다
이에 경향 각지의 선비들이 몰려와 저마다의 붓을 들어 말씀 한 필 짓기를 청하였으나
무슨 비의가 있음인지 도제를 두지는 않았다
- 「천마총」 부분
담대한 자연에 비해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존재인가. 장문석 시인은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천마총’을 들여다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는 한편, 그 속에서 자못 작아지기만 하는 인간을, 스스로를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리하여 「천마총」 속 ‘흰 말’은 “항간에 자신의 이름을 팔아 혹세무민하는 무리가 출몰한다는 풍문에 접하고는/사나흘 장탄식 끝에 스스로 짠 백화수피 14진 속으로 들어가/여태껏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시인은 탄식한다.
겨울 갈대를 소재로 한 시 한 편을 보자. 이는 마치 ‘대지(大地)’라는 어머니가 인간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며 자신을 다 내어주는지를 섬세한 풍경화로 그려낸 한 편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강바닥에 눕혔다”라는 마지막 백미는 시의 여운을 한층 더 깊고도 길게 끌어올린다.
노랑부리개개비 한 쌍이 외진 물골 숨어들다 그만 남으로 가는 일행을 놓치고 말았다 그 철없는 사랑을 위해 허리춤에 작고 아담한 둥지를 틀어 주었다 물기 내린 옷섶이 따뜻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작은 웅덩이를 만들기도 했다 하류에서 피난 온 버들치 가족이 거기에 임시 거처를 정했다 파수를 겹겹 둘러 세우고 살얼음도 살짝 얹어 주었다
(중략)
서로의 뿌리를 얽으며 뜨겁게 사랑도 했다 우우우 온몸을 흔들며 깊어졌다 그러다 새끼들 태어나 초록의 걸음마를 시작하면 기꺼이 그들의 지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강바닥에 눕혔다
- 「겨울 갈대」 부분
겨울은 춥고 어둡고 깊다
상처가 자라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상처는 아무는 게 아니라
덧나는 것, 곪아서 터지는 것이다
깊은 계곡 얼음장 밑에서
가재 한 마리
상처의 급소를 가위질하고 있다
그때마다 눈보라는 내리치고
바위틈에선 청랑한 맥박이 돋는다
아프지 않다
어쩜 너는 급소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이젠
한숨 자 두도록 하자
- 「동지를 지나며」 전문
저물 무렵, 그가 꽃노을 한 필 짊어지고 돌아왔다
수평선을 통째로 물들이는 진홍빛 대단이었다
저 빛이 생의 곡절이라면 아주 먼 바다로부터 출렁여 왔겠다
고래 등 타고 호기롭게 물줄기 뿜어대던 젊은 날도 있었겠다
기항지의 등댓불 바라보며 갈매기도 몇 마리 날려 보았겠다
검은 암초에 부딪혀 하얗게 울부짖은 날도 많았겠다
그리하여 시퍼렇게 멍도 들었겠다 결국은
실핏줄이란 실핏줄 모두 터져 걷잡을 수도 없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토록 장엄하겠는가!
철썩철썩, 가위질 소리인가 하면 바느질 소리
그날 저녁, 그는 손수 마름질한 비단옷 한 벌 지어 입고 수평선을 넘어갔다
밤새도록 등대가 불을 밝혔다
- 「꽃지 노을」 전문
간장독을 여니 바닥이다
간신히 한 종발 뜬다
드르륵, 긁히는 소리
솔아 붙은 소금의 결정이다
맛을 보니 짠맛, 깊다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다
- 「씨간장」 전문
처음 시를 쓸 때에는 미처 몰랐지만 시를 쓰면 쓸수록 시인은 아마도 ‘시’가 두려웠을 것이다. ‘말’이 두려웠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말은 순식간에 조로서도(鳥路鼠道)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테고, 마방이 고삐를 느슨하게 잡은 어느 순간에는 “비루먹은 당나귀” 꼴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마방의 운명 역시 똑같이 추락해 버릴 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오늘도 겨울 얼음장을 보며, 꽃지 노을 대단을 보며 ‘천마’를 향한 길을 부지런히 가고 또 간다. “실핏줄이란 실핏줄 모두 터져 걷잡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장엄”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기에. 시인의 업(業)이란 무릇 기다리고 상처 입는 가운데서 익어 가는 것이기에. 깊고 묵직한 궁극의 “짠맛”을 향하여 시인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