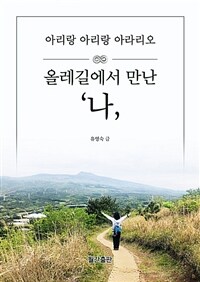-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이무영 지음
- 출판사다온길
- 출판일2020-03-09
- 등록일2020-12-09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29 M
- 지원기기
PCPHONE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책소개
처음 한 끼를 굶을 때는 꼭 미칠 것 같았다. 배가 고픈 것보다도 굶는다는 의식에 울화가 치밀었다. 날이 어둑어둑하여지며 뒷집에서 상보는 소리가 달가닥달가닥 날 때는 아무 보람없는 조바심만 바득바득 났다. 저녁때다. 남은 먹는다. 그러나 나는 굶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달이 닥닥 났다. 결박을 지어놓아서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암상이 바글바글 끓었다.
속이 쪽쪽 훑인다. 손톱으로 박박 긁어내리는 듯이 쓰리다. 뱃속에서는 꾸르륵꾸르륵 밥에 주린 창자가 네 굽을 놓는다. 창자란 체면도 없는 것이다. 흥건하게 괴는 늦침을 꿀떡 삼키면 잠깐 진정되었다가는 금세 발동을 한다.
심열(心熱)은 신열(身熱)과 함께 순간순간에 바짝 오르고 쑥 내렸다. 불덩이같이 확달은 눈동자에는 음식만이 버언하게 보인다. 모든 욕망도 밥 한술에 그쳤다. 구원한 이상도 원대한 포부도 오직 밥 한 그릇에 얽매어졌다. 진리에 대한 탐구욕도, 광적이라해도 좋을 만하던 명예욕도 오직 오전짜리 우동 한 그릇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세 끼니를 쫄쫄이 굶고 나니 밥 생각할 여념도 없었다. 다만 맥이 폭 풀리는 것이 차츰차츰 숨결이 끊어져가는 것만 같았다. 욕망도 의식도 없는 시야에 밥그릇만이 몽롱한 기억같이 떠오른다.
그는 몇 번이나 일어나려고 벼르다가 쓰러졌다. 죽을 힘을 들여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눈앞이 팽팽 내돌렸다. 문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 곰팡이가 덕지덕지 난 사면의 벽은 몇 백 간의 큰 ‘흙’이 되었다 농짝만큼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커졌다 오므라졌다 한다. 다리에는 그의 상체를 가눌 만한 지탱력이 벌써 없었다. 와들와들 떨리기만 한다. 아찔해서 벽이라도 짚고 나면 허공이다. 그러면 밑을 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정신이 어렴풋하게 돌아날 때면 그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쉴새없이 눈물은 줄줄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벌써 먹고 싶어하는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밥이 없어서 굶었다.’는 몽롱한 의식에서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생리적으로 오는 설움이었다.
눈물도 제풀에 걷혔다. 벌써 속이 쓰린 것도 의식할 수 없었다. 다만 눈언저리가 폭 솟아나오는 것처럼 쓰리고 아플 뿐이었다.
그는 처음 쓰러질 그때의 자세로 한동안 누웠었다.
--- “두 훈시(訓示)” 중에서